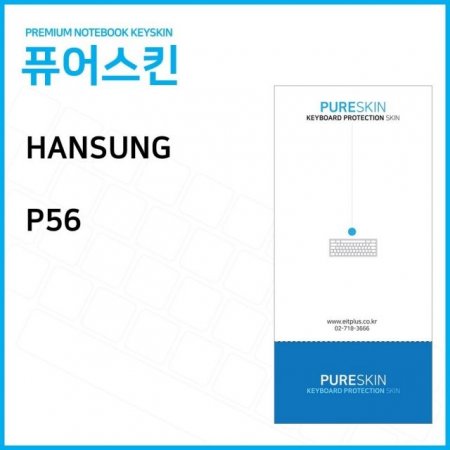솔직히, 솔직하기 너무 힘들다
?
솔직히 이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근데 있는 척도 해보고, 그래서 뭐 왜 어쩌라고 괜한 소리도 해본다.
?
솔직히 말해서 솔직하기 너무 힘들다. 맛보라며 새우튀김 한 접시 가져다 준 옆집 아주머니에게 순식간에 싹싹 비운 그릇을 내밀며 “더 주세요.”를 외치던 눈치 염치 없이 당당하던 그 아이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감각에서 행동까지 오직 한 단계만 필요했던 어린 시절의 나는 성실하게 시간을 건너며 ‘맛있다’와 ‘더 먹고 싶다’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추가 단계들을 빼곡하게 보완해 넣었다. 먹은 흔적은 깨끗이 지우고 빈 접시에는 다른 무언가를 채워 이것이 나에게 올 때와 비교해 어디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살핀다. 그리고 접시를 돌려주러 가다가 다시 휙, 무언가 빼놓은 것은 없는지 또 마지막 점검을 거치는 것이다. 참 눈치 염치 부자로 잘 자랐다.
?
사이가 멀면 먼 대로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사안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솔직하기 쉽지 않다. 말할 수 없어서, 말하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나아서,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해서, 어색해서 민망해서, 등등, 재고 따지고 솔직하지 못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내색하지 않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용되는 일종의 미덕이었고, 크게 우등하지는 않은 ‘모범’의 길을 걸어온 입장에서는 역시 최대한 ‘모범답안’에 가까워야 안심을 했다. 모범답안은, 글쎄, 딱히 뭐라 언급할만한 의미를 찾기는 힘든 것들이었다.
“지금부터 진짜 해야 할 말을 써야겠지요?” 영혜가 우리를 차례차례 둘러보았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텅 빈 껍데기밖에 없는 이야기를 작성하고 있었다. 두리뭉실하게 옳은 말들. 이 뜻도 저 뜻도 아닌 중립적인 말들. 아무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만이 겨우 살아남아 있었다. 오직 착하고 선한 말들. 선의만 남겨놓느라 공허해진 글이 되어가고 있었다.
- 임솔아, ?『눈과 사람과 눈사람』? 192쪽
?
실은 솔직함이 야기할 불편이 솔직하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불편보다 더 크고 번거롭게 느껴지는 탓도 있었다. 에이 뭐 됐어. 하는 생각과 함께 괜찮은 척이 쌓여가는 것이다. 인간 누구나 수시로 잔뜩 하게 된다는 악의 없는 거짓말들이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불어나는 것이다. 괜찮은 척과 거짓의 뒷면에는 입술에까지 왔다가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고 삼켜지는 말부터 스스로도 아직 깨닫지 못한 저 너머 차원의 솔직함의 영역도 있을 테다. 그것들을 대신해 앞으로 나선 이런저런 ‘척’들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어깨를 맞대고 말과 행동의 활동 반경을 만든다. 제한한다. 멋모르던 아이를 멋모르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성인으로 만든다.
?
그러다 한번씩은 이러다 내가 죽지 싶어 에라 모르겠다 속내를 털어놓을 때도 있다. 어지간한 일이라면 거절하지도 발끈하지도 않는 늘 적당히 좋은 사람으로 있지만 이번엔 그냥 못된 애가 돼 버리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 역시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말이다. 이상하게도 아니 당연하게도 이 솔직함이라는 것이 나 혼자의 도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 피차 다양한 척에 둘러싸여 살다 보니 어쩌다 한번 마음먹고 하는 나름의 단호한 표현도 농담이 되거나 곡해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상대가 진짜로 받아주지 않으면 그 솔직함은 끝내 완성되지 못한다. 나만 아는 반쪽짜리 솔직함으로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자기만족에서 그치고 말아 조금은 아쉽게 되는 것이다.
?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영 의미가 없는 일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당신과 나 자신과 상황과 기타 불가피한 일들과 꾸준히 갈등하며 다져온 시간, 피와 땀과 눈물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물쭈물 갈팡질팡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치열하고 지난한 자아성찰의 과정이면서 결과이기도 하다.
?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공감하고 나면, 완전하게 솔직한 문장을 쓸 수는 없게 된다. ‘솔직하다’라는 의미 역시 달라지고 만다. 글을 쓴다는 것은 ‘최초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언제나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품어야 한다. 끊임없이 자신을 분리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대화하게 만들고 중재해야 한다. 글쓰기의 시작은 두 개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문장이 한 사람의 목소리로 적어가는 것이라면, 문단은 두 개의 마음이 함께 써내려가는 것이다.
- 김중혁, ?『무엇이든 쓰게 된다』? 86쪽
?
오늘도 ‘맛있다’와 ‘더 먹고 싶다’ 사이에 밀어 넣었던 것들을 다시 본다. 뺄 것은 빼 본다. 앞뒤없이 솔직한 나와 미안하게도 솔직하지 못한 내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서로 납득할만한 솔직함을 찾는다. 싸우고 대화하고 중재한다. 모범적이지 않은 생각을, 말을, 글을 향해 간다. (그런데 솔직히 오늘도 충분히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