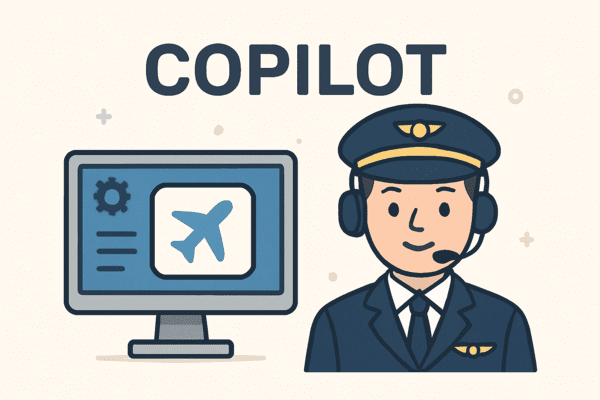[데스크칼럼] IE 실패 역사 코파일럿서 재현…AI가 독이 아니라 MS 전략이 독

마이크로소프트(MS)의 최근 AI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열심히 코파일럿 띄우기에 나섰지만, 예상과 달리 시장 점유율은 극히 미비하다.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와 경쟁자라기 보다, AI 스타트업의 시장 점유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모습을 보인다. MS의 AI 전략 균열은 과거 인터넷 익스플로러(IE)의 실패에서 제대로 교훈을 얻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MS는 코파일럿을 단순한 선택 기능이 아닌, 사실상의 ‘필수 옵션’으로 만들었다. 윈도우, 오피스, 팀즈 등 핵심 제품군 전반에 코파일럿을 깊숙이 끼워 넣으며 'AI를 쓰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왔다. 문제는 이 전략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보다는 피로감과 반감을 키웠다는 점이다.
많은 기업 고객과 개인 사용자는 필요해서 쓰는 AI가 아니라 안 쓰면 불편해지는 AI를 마주했다. 업데이트 이후 갑자기 생겨난 코파일럿 버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권유 메시지, 기존 워크플로를 끊는 추천 기능은 생산성을 높이기보다 업무 흐름을 방해했다. AI가 조용히 뒤에서 돕는 도구가 아니라, 전면에 나서서 간섭하는 상사처럼 느껴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가격 정책이다. MS는 코파일럿을 프리미엄 기능으로 묶으며 기업용 구독 구조를 사실상 재편했다. 기존에 사용자당 월 12.5달러(약) 수준이던 Microsoft 365 E3·E5 이용 기업은, 코파일럿을 쓰기 위해 사용자당 월 30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단순 계산만 해도 직원 1000명 규모 기업은 연간 36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중소기업을 겨냥해 최근 일부 요금을 낮췄지만, AI를 쓰지 않아도 요금 인상의 압박을 받는다는 불만은 여전하다.
이용 강요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신뢰를 갉아먹는다. MS는 과거에도 비슷한 실수를 반복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IE)다.
한 때 윈도우에 기본 탑재된 IE는 사실상의 표준 브라우저였다. 하지만 선택권을 제한하고 개선 속도를 늦춘 결과, 사용자들은 크롬과 파이어폭스로 이동했고 IE는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기술 경쟁에서 밀린 것이 아니라, ‘강요된 표준’에 대한 반발이 만든 실패였다.
코파일럿은 IE 실패의 연장선에 있다. 윈도우 업데이트 강제, 엣지 브라우저 밀어내기와 마찬가지로 기술은 뛰어나지만, 쓰게 만드는 방식은 서툴다는 MS에 대한 오래된 평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쟁사들은 정반대 전략을 취하고 있다. AI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선택권을 열어두고 자연스러운 통합을 강조한다. 사용자가 필요성을 느낄 때 스스로 쓰게 만드는 방식이다. 챗GPT나 제미나이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파악한다. MS와 경쟁사 간 전략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고, 이것이 MS의 실적 둔화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MS의 AI 전략에 대한 평가는 AI 기술 자체의 실패라기보다 AI를 다루는 MS의 태도에 대한 경고에 가깝다. 기술은 강요할수록 멀어진다. 코파일럿이 진정한 생산성 도구로 자리 잡으려면, MS는 먼저 한 발 물러서야 한다. 쓰라고 밀어붙이는 AI가 아니라, 안 쓰면 아쉬운 AI로 돌아갈 때다.
코파일럿은 독이 아니다. 다만, 그렇게 만든 전략이 독이었을 뿐이다.